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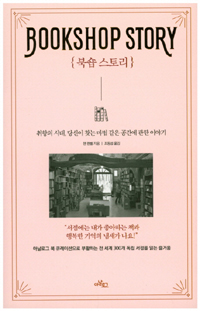
(사진1)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 곁에 자리 잡은 '리브레리아 아쿠아 알타(Libreria Acqua Alta)' 서점. [사진제공 = 글담]
북숍 스토리 / 젠 캠벨 지음 / 조동섭 옮김 / 글담 펴냄 / 1만5000원
한 질문에서 시작된 여행이었다. "서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에든버러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은 젠 캠벨은 서점에서 일하며 글을 쓴다. 런던의 고서점 리핑 얀스에서 근무하며 서점에서 겪은 황당한 일들을 책에 담은 '서점 손님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됐다. 두 번째 책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인 서점을 찾아 떠난 여행기를 담았다.
무려 전 세계 300개의 서점을 찾는 여행을.
첫 여행지는 스코틀랜드의 공식 책도시 위그타운. 인구 1000명 안팎에 불과한 작은 도시는 1960년대 철로가 폐쇄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주된 일터였던 유제품 가공 사업은 부진해졌다. 그때 보석상을 하던 존 카터는 보석을 몽땅 도둑맞은 뒤, 빈 가게에서 싼 물건을 팔기로 했다. 책이었다. 이후 30년 동안 서점은 점점 커졌고, 창고나 가정집 거실에도 서점이 생겨나 중심가에는 20여 개의 서점과 출판사 제본소가 자리 잡게 됐다. 연례 책 축제까지 시작됐다. 매년 가을이 되면 열흘간 서점 주인과 작가, 독자들은 200가지의 행사를 치른다.
위그타운에는 헛간을 신화와 동화로 채운 '바이어 북스'나, 케이크와 홍차를 파는 '리딩래시스 북숍 앤드 카페' 같은 곳이 있다. 하지만 이 마을의 간판은 '더북숍'. 책장 길이만 2㎞에 달하는 큰 서점이다. 시집 코너엔 낡은 벽난로가 있고 여행 코너엔 모형 철도가 설치돼 있다. 주인인 숀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연회비만 내면 매달 중고책을 보내주는 '랜덤 북클럽'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서점 한가운데에 침대를 놓고 잘 곳을 제공하기도 한다.
뉴캐슬에서 자란 저자는 에든버러대에 입학한 뒤 캠퍼스 모퉁이마다 자리 잡은 독립 서점을 만날 때마다 감탄하곤 했다. 그러다 처음 일을 시작한 서점은 에든버러 북숍이었다. 티가라는 이름의 크고 다정한 개가 있었고, 서점 옆 카페에서는 조앤 롤링이 글을 쓰곤 했다. 롤링이 치마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한 사건으로 1년간 행복했던 적도 있었다. 이 서점은 '솔직히 책 팔러 왔어요'라는 행사를 열어 작가들을 책을 팔도록 초청한다. 이언 랜킨, 매기 오패럴, 비비언 프렌치와 같은 스코틀랜드 작가들이 미소를 지으며 책 파는 걸 상상해보라.
잉글랜드에서 처음 만난 서점은 바터 북스다. 기차를 사랑하는 영국 남자와 책을 사랑하는 미국 여자가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나 쪽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고 3년 뒤 결혼에 골인했다. 노섬벌랜드 안위크의 빅토리아시대 기차역에 둘은 서점을 세웠다. 유럽에서 가장 큰 중고서점으로 꼽히는 이곳 책장 위로는 모형 기차가 달리고, 선반 위에는 시가 적혀 있다. 대합실에는 석탄 난로가 놓였고, 역장 사무실은 차를 마시는 곳이 됐다. 벽에는 화가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서점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단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다. 부부는 어느 날 경매를 통해 책을 사다가 책 상자 속에서 먼지 덮인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Keep Calm and Carry On(침착하게 계속 나아가자)'이라고 적힌 포스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습을 앞둔 영국이 만든 만일을 대비해 만든 포스터였다. 부부는 포스터를 서점 벽에 걸었다. 손님들이 좋아하자 복사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후 머그잔, 카드, 티셔츠 등에 프린트돼 팔리며 21세기 최고의 유행이 됐다.
그런가 하면 스카신 북스는 미로 같은 서점 곳곳에 독자를 위한 깜짝 선물을 숨겨두는 서점이다. 예를 들어 높은 대들보에는 '키가 아주 큰 아버님께 드리는 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3파운드의 책 쿠폰을 주는 식이다.
책에는 많은 독특한 서점이 소개되지만 '북 바지'보다 놀라운 곳은 없다. 북 바지는 리치필드항에 정박해 있다. 전장 18m의 배가 서점이다. 소파와 타자기가 멋지게 장식돼 있고, 책장 곳곳에는 책 쿠폰도 숨어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 부르는 토끼도 살고 있다. 독특한 서점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서점 베스트 10' 등에 뽑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니었다.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건 출항이었다. 반년 동안 영국 운하를 도는 여행을 결심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배가 도착할 곳을 알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책과 교환을 해주기도 했다. 1500㎞를 여행하며 배에서 비둘기를 길렀고 도둑도 만났다. 토요일 아침에는 아침을 만들어 조찬 모임을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선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책만을 파는 중고서점 '앨라배마 북스미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마을인 '헤이 온 와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리브레리 파피용' 등 세계 곳곳의 이색적인 독립 서점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점의 면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는 건 책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책 없이 책과 사랑에 빠져 서점을 연 사람들도 있고, 손님과 사랑에 빠진 서점 주인 이야기도 있다. 서점에서 만난 작가들의 인터뷰에선 그들이 어떻게 책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시시콜콜 취재한다.
반스앤드노블과 같은 대형 서점도 밀려나고, 종이책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시기에 저자가 품은 질문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자는 여행을 통해 침몰하는 서점과 반짝반짝 빛을 내는 서점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 가만히 앉아서 책이 팔리기 기다리는 게으른 서점은 스스로에 희생되고 있었다. 동시에 수많은 독립 서점은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점점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면서 저자는 확신을 갖게 됐다.
"서점이야말로 바쁜 세상에서 누구나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동심에 경이감과 모험심을 스미게 하는 마법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서점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서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 2017.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