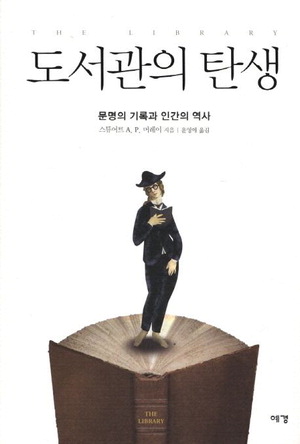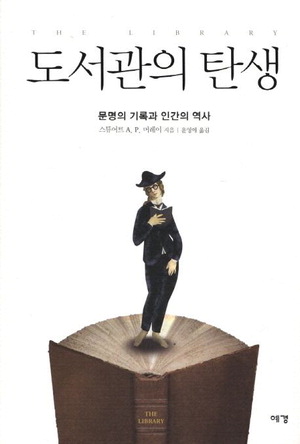
3000년의 인류 도서관 역사를 현미경처럼 관찰한 명저
서삼치(書三痴)란 말이 있다. '책과 관련된 3대 바보'를 뜻하는 말이다. 책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빌려달란다고 진짜로 책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책을 돌려주거나 돌려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저 농담의 행간에는 책을 소중히 다루라는 교훈이 담겼다.
'바보'가 되지 않고도 책을 빌려보는 자유의 처소가 있으니 바로 도서관이다. 스마트폰을 켜고 주변 도서관을 검색해보라. 천지 사방이 도서관이다.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도 책을 안 읽는 시대지만 말이다.
스튜어트 머레이의 2009년 작 '도서관의 탄생'은 인류의 집단적인 기억으로서의 도서관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들여다보는 책이다.
도서관은 한때 열강의 자존심이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소아시아 페르가몬에 새로 생긴 도서관 때문에 명성에 도전을 받았다. 이집트는 자국 도서관 명성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해 파피루스 수출을 거부한다. 페르가몬 도서관은 이 때문에 다른 책 재료가 필요했고, 그들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택했다. 양피지는 영어로 'parchment', 라틴어로 'pergamenum'이라고 쓰는데 이는 페르가몬 도서관의 흔적이다.
도서관은 전리품이기도 했다. 전쟁을 치르는 대국에 속한 도서관의 운명은 '방화'와 '정복' 둘 중 하나였다. 농사를 짓든 무기를 제조하든, 도서관 자료는 국력과 연결된 총체였다. 사람들은 도시 함락 시 도서관에 담긴 기술이 경쟁국에 넘어가는 걸 막으려 했다. 때로 도서관이 불에 탔다는 건 단순한 화재가 아닌 의도된 행동이었다.
중세로 넘어오면서 도서관엔 필경사가 등장했다. 필경사들은 양피지 낱장을 바르게 펴고 햇볕 아래에서 글을 썼는데, 이는 그래야만 잉크가 잘 말랐기 때문이다. 인쇄기 없던 시절,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개월이었다. 워낙 고된 노동이다 보니, 필경사들은 본문이 끝나는 지점마다 소회를 적어뒀다. "이젠 쉴 수 있겠네" "모두 끝냈으니, 이제 돈을 주세요" 등의 낙서가 현대에도 전해진다.
도서관은 책도둑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사서들은 아예 책에 사슬을 매달아뒀다. 사서들은 책도둑을 만나면 살인자를 만난 듯이 격노했다. 도서관에는 저주의 글귀가 내걸리기도 했다. "누구든 이 책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파멸 또는 오랜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다"란 경고문이었다.
도서관은 그러므로 고리타분한 지식의 저장소만은 아니다. 그것은 각 권이 하나의 몽상으로 연결되는 꿈의 저장소다. 도서관 서가에 앉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건 그 때문이다. 서점이 빳빳한 새 종이의 냄새라면 도서관의 묵은내는 시간의 흔적이다. 그건 오랜 시간 사람들이 책을 만지고 책장을 넘기면서 보냈던 경험의 축적이기도 하다.
"책이 없으면 신은 침묵하고, 정의는 잠자며, 과학은 정체되고, 철학은 불구가 되며, 문학은 벙어리가 된다." 이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 매일경제 2024.01.20 김유태 기자

|